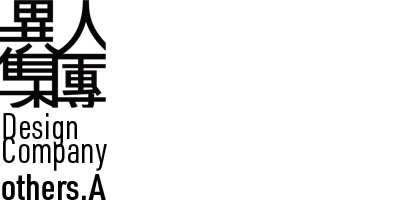도시와 자연의 경계
대지는 금산을 등지고 북동사면으로 낮은 자락이 펼쳐진다. 그리고 전면에 정촌 일반산업단지를 지척으로 바라보면서 마주하고 있다. 금산과 그 넘어 예하리는 과거부터 빈약하고 느슨했던 장소였으나 정촌, 뿌리 산업단지에 에워쌓여 인위적 경계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새롭게 삽입된 산업시설의 도시적 조직과 기존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조직이 오버랩되는 전이적 위치로 두 질서의 완충지대로서 상징적 경계가 필요하다.
대지는 금산을 등지고 북동사면으로 낮은 자락이 펼쳐진다. 그리고 전면에 정촌 일반산업단지를 지척으로 바라보면서 마주하고 있다. 금산과 그 넘어 예하리는 과거부터 빈약하고 느슨했던 장소였으나 정촌, 뿌리 산업단지에 에워쌓여 인위적 경계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새롭게 삽입된 산업시설의 도시적 조직과 기존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조직이 오버랩되는 전이적 위치로 두 질서의 완충지대로서 상징적 경계가 필요하다.
공간의 공감과 경계
경계는 두 질서가 혼재된다.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산업단지에 면한 경계의 북쪽의 공간은 긴장감있고 타이트하다. 마주하는 산업 단지를 닮았으며, 경계의 남쪽은 자연으로 열려있고 틈을 열어 수용함으로 확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또한 마주하는 면을 닮아 있다. 언제든지 연결된 산책로로 금산을 즐길 수 있다. 공간의 경계는 긴 벽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고 넘나드는 공간은 경계를 공감할 수 있게 한다.
경계는 두 질서가 혼재된다.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산업단지에 면한 경계의 북쪽의 공간은 긴장감있고 타이트하다. 마주하는 산업 단지를 닮았으며, 경계의 남쪽은 자연으로 열려있고 틈을 열어 수용함으로 확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또한 마주하는 면을 닮아 있다. 언제든지 연결된 산책로로 금산을 즐길 수 있다. 공간의 경계는 긴 벽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고 넘나드는 공간은 경계를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사람과 공감
이 시설의 역할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삶터의 사람과 공단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이다.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 주민복지 그리고 산단을 위한 공유공간이다. 어떻게 보면 쉽게 수용될 수 없는 경계를 가진 집단 공동체를 한 공간에 담는 듯 하지만 미리 마주하고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는 건축적 장치로 작동할 것을 기대한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전이영역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가장자리 효과로 특성을 오롯이 간직한 다양성이다. 그리고 시간이 그것들을 일체화 한다. 도시도 자연도 지역 삶터도 산단도 그리고 이 곳을 구성하는 사람도 이곳에서 공감하며 일체화 될 것이다.
이 시설의 역할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삶터의 사람과 공단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이다.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 주민복지 그리고 산단을 위한 공유공간이다. 어떻게 보면 쉽게 수용될 수 없는 경계를 가진 집단 공동체를 한 공간에 담는 듯 하지만 미리 마주하고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는 건축적 장치로 작동할 것을 기대한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전이영역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가장자리 효과로 특성을 오롯이 간직한 다양성이다. 그리고 시간이 그것들을 일체화 한다. 도시도 자연도 지역 삶터도 산단도 그리고 이 곳을 구성하는 사람도 이곳에서 공감하며 일체화 될 것이다.